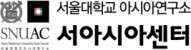지난 21일 캐나다와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이튿날 유엔총회장에서는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호주·룩셈부르크·몰타·벨기에 등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오랫동안 선언적 구호로만 머물러온 ‘두 국가 해법’이 세계의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팔레스타인의 운명이 다시 국제 정치 무대 한가운데 놓였다는 점은 중동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 50개국 외교관 100명 이상이 집단 퇴장하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미국과 영국 대표단은 자리를 지켰지만 고위급 대신 하급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고, 네타냐후는 텅 빈 총회장을 향해 연설을 이어가야 했다. 일부 지지자들의 환호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야유와 비난이 뒤섞이며 총회장은 혼란스러웠다.
현장의 현실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가자의 병원은 전력과 연료가 끊겨 수술실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이 호흡기를 잃은 채 세상을 떠난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아로 숨진 이는 최소 273명이고, 그중 112명은 어린이였다. 국경에는 구호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봉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투하된 물품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 봉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밀쳐내며 몸부림친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전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더 이상의 지연은 곧 공모이며, 침묵은 방조일 뿐이다.
이 절망적인 현실은 팔레스타인 영화 <그라운드 제로로부터>의 단편 ‘소프트 스킨(Soft Skin)’에서 더욱 뼈아프게 드러난다. 가자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팔에 이름을 새겨 넣는 까닭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잉크 자국 하나하나에는 아이를 지켜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차마 내뱉지 못한 울음이 고여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이름이 새겨진 이후로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공습 직후 흙먼지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아이들의 얼굴은 어떤 통계보다도 가혹한 현실을 압축한다.
맨발로 뛰어가는 소년의 흐느낌, 동생을 업은 채 달아나는 어린아이의 눈빛은 숫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의 진실이다. 그러나 그토록 반복되는 장면들 속에서 세계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아이들의 절규가 들려옴에도 무심히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방관이자 또 다른 폭력이다.
한강 작가가 물었듯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가자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생명들의 절규가 지금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며, 그들의 기억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가 더 침묵한다면, 그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