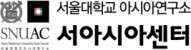지난 주말 이란 테헤란은 39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44도, 이라크 바그다드는 45도를 기록했다. 올해 7월17일 이란 남부 페르시안걸프 국제공항의 기온이 66.7도를 기록하면서, 최대 더위 지수를 넘어선 초고온을 보이고 있다. 중동의 뜨거운 여름 날씨는 악명 높지만,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지된 이상기후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중동 국가들 대부분이 일상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중동의 기후변화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위기를 넘어 정치·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 내전을 촉발한 원인이 가뭄 등 기후변화였다는 분석은 꽤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기후 온난화 현상은 앞으로 ‘제2의 아랍의 봄’이 일어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걸프 국가들을 중심으로 몇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해왔다. 걸프 중심 산유국들은 앞다퉈 기후변화에 맞서는 한편 기후행동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아랍에미리트 비전 2030’ ‘오만 비전 2040’ 등 경제개혁 플랜을 선언하고 있다. 실제로 걸프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한 사막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오만 등 걸프만 해안가 도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과 비전들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동 국가는 부유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예멘, 이라크, 레바논과 같은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이라크와 예멘의 사례를 보자. 요즘 이들 지역은 극심한 더위와 잦은 정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와 예멘에서는 기후 관련 이주자인 ‘환경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국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독일의 소리)의 최근 분석 기사에 따르면, 이라크의 기후위기는 기후난민을 발생시켜 문화적 충돌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유엔 국제이민기구(IOM)의 분석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만 최근 5년 새 8만3000명 이상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실향민이 됐다.